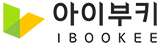house hunting
|
기획의도: 서울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노마드의 도시다. 부동산이 삶보다는 자산의 중심축이 된 사회에서 모두가 집을 소유하는 일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나의 존재를 보장하고 자리를 점유할 수 있으며 환대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다만 그것이 공간 자체로만, 소유나 독점이라는 방식으로만 성립되는 것일까? 노마드의 도시에서 공간은 어떻게 ‘집’이 되는가? 도시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가? 그 질문과 관련해 ‘공유주택’을 선택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안생활> 입주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획/집필/촬영: 윤성희 인터뷰 참여: <장안생활> 입주민 4인 후원: 무아레서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알디 님 이야기
장안생활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2021년 무아레서점 일을 하다가 작년 4월쯤 입주했어요. 출퇴근 문제도 있고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할 이유도 생겨서 집을 구하는데 장안생활 입주 신청해놨던 게 돼서. 혼자 자취할 때는 사람들 불러서 밥 해 먹고 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 걸 잊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맞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구나' 싶더라고요.
이 공간에 자리 잡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주로 하신 일이 있나요.
집 정리죠. 전에 공유부엌을 운영했을 때 썼던 집기들을 다 싸왔는데 짐을 일단 넣고 보니까 누울 자리만 남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니까 한두 달은 아무 것도 못 했어요. 그땐 밥 해먹을 생각도 안 들고 공유공간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서점 아니면 집에만 있었어요. 공유주택에서는 이방인이었죠. 시스템도 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뭔가 선뜻 먼저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 손댄 게 7층 공유부엌이에요. 내 냄비 같은 걸 다 빼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해도 되냐 물어봤는데 (운영사가)되려 좀 해달라고.(웃음) 그때는 입주민 자치회도 활동 안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민들끼리 공간을 정리해보자고 글도 올리고 회의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지금의 정돈된 환경은 제가 다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웃음) 그렇게 부엌부터 정리해서 밥을 해 먹다가 거기선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럼 그냥 인사부터 하자’ 해서 그냥 누구 마주칠 때마다 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두 명씩 같이 밥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다보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 주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엔 5층 정리하고 6층도 손보고 4층 텃밭이랑 부엌도 손 보고, 4층에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 이사 오셨는데 얘기가 잘 통해서 그분이 4층 부엌 관리해주시니까 거기도 자주 가게 되고.
이 공간에 정을 붙여간 과정은 말하자면 공간을 꾸며온 시간들이네요.
그렇죠. 서점도 그래요. 액자 하나 넣는 것도 다 우리 선택이잖아요. 다 의도가 있고 우리 손때가 묻었죠. 여기 화분도. 이게 어떤 이유로 내가 거둬서 이 자리에 뒀고 이걸 갖고 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었지 이런 기억이 묻어 있는 거예요. 공유공간에서 같이 밥 해먹고 술 먹고 지원 사업 계획서도 같이 쓰고,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가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서는 누구랑 이런 걸 했어' 이런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공간에 정이 들었던 거 같아요. 이라는 책에서 그래요.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려면 공간을 꾸미면 된다'고. 공간을 세팅할 수 있는 설정값을 열어주면 애정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는 그게 다 열려 있고, 내가 끈기 있게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나랑은 그런 지점에서 잘 맞아요. 부엌도 이왕 만드는 거 가능한 선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세팅도 하고. 뭐랄까 맞춤 정장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더 즐겁게 살고 있지 않나 싶고.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내 집에서는 침대. 최근에 빔 프로젝터를 샀어요. 벽에 딱 쏘고 침대에 기대서 그걸 보거든요. 요즘은 그 순간을 제일 좋아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4층 텃밭. 그런데 '최고의 한 곳'을 집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상황에 맞춰 최고인 지점이 다 있어서요. 밥 먹을 때는 7층 부엌이 제일 좋은데 책 읽거나 쉴 때는 내 집이 좋고. 뭔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으면 4층 텃밭, 아니면 서점 화분들 자리.
집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실 것도 같은데요.
소유 대신 점유나 공유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성북동 마당 있는 전원주택 막 이런 데 살고 싶죠. 근데 여기는 내가 이 건물에서 쓰는 공간 대비로는 임대료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에만 있으면 좁지만 공유공간까지 쓰면 넓으니까요. 일반 원룸에 갔다면 뭘 안 했겠죠. 원룸에선 불러봤자 네 명이면 끝이지만 여기는 공유부엌이 크니까 좀 더 큰 걸 상상해볼 수 있고. 테라스도 베란다도 있으니까 또 뭔가를 하게 되는데 있는데 그걸 여기 운영사에서도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활동이라고. 거기서 나는 또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보니 여기 공간이 다 내 공간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어요.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진 공유주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뭘 하고자 하면 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곳이 꽤 맞는 시스템인 거죠.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일이 더 벌어지기도 해요. 여기 기반으로 지원사업 같은 것도 하고, 취미를 ‘이식’ 당하기도 하고. (웃음)
가드닝이 바로 그런 건데요. 서점에 선물로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 관리를 해야 하니까 책을 찾아보면서 했죠. 어떤 때는 화분이 죽고, 어떤 때는 살아나기도 하는데 뭔가 그렇게 식물이 응답하는 걸 들으니까 그때부터 취미가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또 여기 4층 텃밭이 죽음의 땅(?)이 돼 있는데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 모아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중랑천 텃밭까지 가게 됐어요. 오늘도 거기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배추 심고 왔어요. 원래 내 밭은 한 개였는데 제가 수업 듣는 곳에서 밭을 세 개 더 쓸 수 있게 돼서 밭이 네 배가 됐어요. 사람들이랑 배추를 키워서 김장을 같이 해보겠다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휴, 열사병 와서 쓰러질 뻔 했네요. 원래 내가 농사에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고향집 텃밭이 굉장히 커요. 봄마다 노동력을 거기에 착취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웃음)
이곳은 거주지이지만 정착지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자가 보유나 정착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다른 집을 갔어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내 집'을 사서 가졌다고 해도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딱 와 닿지는 않거든요. 집을 소유하느냐 공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자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나는 지금은 재미있게 살고 있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과 타인과 연결되고픈 마음,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나요.
그게 상충하는 것 같은데 또 공존할 수 있는 욕망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누가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런 거리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사람 많이 만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안 나가고 집에 있거든요.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나는 그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살다 나가시더라고요. 이곳 운영사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친화적인 입주민을 선정하려는 거 같아요. 그래도 개인생활 위주로 사는 분도 있거든요. 부엌만 가끔 이용하고 인사만 나누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것도 존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이지만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환경도 어떻게 보면 입주민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으면 내가 파티 할 자리가 없어지니까 나랑 다른 분들도 좀 있어주는 게 좋겠죠?(웃음) 지금 입주민이 32명인데 현실적으로 모두가 친할 수도 없고요.
매우 느슨하거나 일시적인 연결, 접촉이도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네요. '그런 느슨한 만남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나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그런 관계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건물에 산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인데, 그것도 내 선택이 아니고 우연찮게 같이 살게 된 건데 그런 기반을 갖고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아요. 나는 지금 이 느슨한 게 좋은데.
물론 일시적이라는 게 아쉽긴 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값이고 영원이란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게 아닐까요. 원룸 살 때는 옆집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아니죠. “식사 하셨어요? 안하셨음 같이 드실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에 같이 저녁 먹고 그게 즐거웠으면 오늘 재밌었다 하고 잠들면 그건 그대로 또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오래 보는 관계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넓은 도시에서 옆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냥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만 돼도 도시가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애정을 더 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